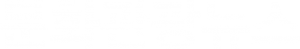다정한 상상력으로 인식의 전환 꾀하는 너와 나, 그리고 죽은 물고기들을 위한 송가

혜원아트갤러리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정한 상상력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나안나 작가의 개인전 ‘끝나지 않은 순간들’을 개최한다.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수학한 작가 나안나는 무의식과 의식이 조우하는 환상적 세계를 담은 회화 작업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무의식 속에 떠다니는 이미지 조각을 잡아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그의 작업은 경험과 생각, 상상 속에서 잡아 올린 이미지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의 사유를 들춰낸다.
작업이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을 붙잡아 하나의 존재로서 기록을 남기는 과정으로, 이 기록들은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풍경이자 작은 세계를 이루고 그들만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한 붓질로 우리 주변의 사소한 사물들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나안나의 작업은 보는 이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어 우리의 경직된 사유에 균열을 내고 인식의 전환을 이끈다.
‘죽은 물고기들을 위한 송가’
부드럽고 포근한 색채의 배경 위 모난 데 없이 둥그런 대가리에 커다란 눈망울로 귀염성 있게 의인화된 물고기가 주제부를 차지하는 나안나의 작업은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 생물과 해녀가 등장하는 몽환적 세계를 통해 관람자에게 다정한 재치와 해학을 선사한다.
넓고 깊은 바다에서 자유로이 유영하는 물고기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물고기는 바다의 비밀을 간직한 신비롭고 존귀한 생명체가 아닌, 그저 인간의 먹을거리로 치부되는 ‘생선’일 뿐이다. 수산 시장에서 수많은 물고기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일을 계기로 작가는 이들이 각자의 생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림으로나마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줬다. 물고기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화관을 씌워 꽃가마를 태우듯, 극락세계의 상징인 연꽃으로 물고기의 주변을 장식했고 이 그림들이 하나둘 모여 ‘초상화’ 연작이 됐다.
‘모던 어해화(魚蟹畫)’
물고기를 주제로 다양한 식물문양이 배경을 이루는 나안나의 작업은 일견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민화(民畵), 또는 불화(佛畵)로서 전통적 요소들을 계승한다. 물고기 그림은 조선시대 민화 중 널리 그려졌던 어해화(魚蟹畫: 수생 생물을 그린 그림)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을 많이 낳는다는 점에서 다산(多産)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더불어 밤에도 눈을 뜨고 자는 종특성으로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길상벽사(吉祥辟邪)의 의미로, 힘차게 튀어 오르거나 용으로 변태하는 장면은 입신양명(立身揚名) 의미로도 이해됐다.
한편 나안나의 작업에서는 불화의 요소들도 다수 포착되는데 연꽃, 나뭇잎과 같은 자연물의 형태와 무늬뿐만 아니라 윤곽선을 그린 뒤 안쪽을 채색하는 구륵법(鉤勒法)과 선으로 윤곽만 그리는 백묘법(白描法) 등의 표현 기법 또한 불화에서 차용된 것이다. 그러나 전통 회화에서 물고기가 길흉화복을 빌기 위한 대상으로만 다뤄졌다면 나안나의 작업에서는 작가 자신 또는 인간의 생애라는 사적 의미가 투영된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확장된다.
‘너와 나’
작품에서 식탁에 오르기 위한 여러 상황에 놓인 물고기들의 처지는 보는 이에게 소박한 웃음을 유발한다. 하지만 관람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커다란 눈망울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하다. 입에 낚싯바늘이 걸리거나 수풀 뒤에 숨어있는, 또는 달빛 아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애잔한 얼굴. 그리고 먹이사슬 하단의 작고 흔한 종이라는 점은 우리 모습을 닮아 왠지 더 측은지심이 든다. 이 물고기들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희망을 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습과 삶을 대변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처럼 나안나의 작업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익숙한 세계를 다시금 생경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지녔다. 따뜻한 봄, 다정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힘을 경험해보기 바란다.
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