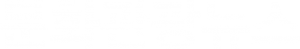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당신의 자애로움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는 늘 군림하는 존재로만 기억 속에 존재한다.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늦가을 빗줄기가 낙엽을 두들기는 소리에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어느새 수북이 쌓인 낙엽이 겨울을 재촉하며,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초등학교 울타리를 지나는 출근길에 간혹 우산 속에 묻힌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종종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가 운동장을 지나 교실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있는 아빠의 모습에서 한없는 애정이 묻어난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새삼스럽게 하는 장면이라 울컥하는 마음에 추억의 파노라마를 펼쳐본다. 사실 나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은 별로 없다. 평범한 생활이었기에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확증편향일까. 철없는 아이였지만, 자존심과 부끄러움에 기억을 지웠던 것 같다.
자애로운 모습으로 기억 저편에서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온통 그리움으로 사무친다. 어릴 적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상한 얼굴이다. 근엄하셨던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늘 훈계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은 떠나시고 나서야 깨달았다. 미처 부모님의 온정을 느낄 새도 없이 생활에 쫓기다 철들면서 객지로 나갔기 때문이다. 부자간의 정겨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리움으로 채워졌었다.
오두막 토담집에서 부모님과 육 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기억이 새롭다. 그 집을 보존했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찾아낼 텐데, 헐어버리고 새집을 지었다. 당시는 옛것의 귀중함을 생각지 못해 추억거리들을 모두 쓰레기로 처리해 회상할 기억이 별로 없다.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요즘 부모와 달리 당신의 자애로움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는 늘 군림하는 존재로만 기억 속에 존재한다.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호통을 치지도 않았고, 매를 맞은 적도 없지만, 연로하신 눈길에서 자상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늘 어려워 가까이하지 못했다. 세상을 여의고 나서야 누구보다도 애정이 깊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아픔만 마음 한구석에 생채기를 낸다.
동네에서는 어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소문났지만, 가족에게는 유독 엄했던 기억만 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쉼 없이 일만 하셨다. 차남으로 상속 재산이 크게 없었던 아버지는 소작농을 한 기억도 있다. 당시 어린 마음에 돈을 벌면 논밭부터 장만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다. 농사로 겨우 양식은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자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날품팔이를 하셨던 것 같다. 마을 연못의 ‘땅떼기(땅을 파서 덜어냄)’도 했고, 수리조합 물관리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정비에서부터 연탄배달 등 돈벌이가 되는 일은 마다않고 찾아 나섰다. 간혹 어머님의 푸념을 들을 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아버지가 무능해서 고생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당연히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저런 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방과 후에는 소 풀 먹이러 ‘하늘재’로 올라갔다. 당시는 큰 ‘귀목나무’가 하늘재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귀신나무’라는 동네 어르신의 충고에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잘라내 버렸다고 한다. 동네 아이들은 소를 몰고 그곳으로 올라가 소를 풀어 놓고 귀목나무 그늘 아래서 놀았다. 형들이 씨름을 붙인 기억이 난다. 씨름에서 지고 나면 집에 와서 씩씩거리자 아버지는 사내자식이 왜 그러냐며 야단을 치셨지만, 남몰래 한숨을 짓기도 하셨다. 초등학생 때는 유달리 빈약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술을 드신 날은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김치 해장국밥’을 끓이셨던 기억이 난다. 술 드신 날은 밤새 아웅다웅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인생을 들려주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이해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될까. 친구 같은 아빠,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만…..
글 본지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