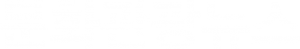음력 10월은 시향(時享)을 지내는 계절이다. 코로나 이전 시절 같으면 고속도로가 시향 객들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시향은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로 시사(時祀), 시제(時祭),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시사철만 되면 아픈 추억들이 그리움으로 남아 아른거린다. 당시의 상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한 편의 역사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뇌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 재현이 쉽지 않다. 어렴풋이 간직하고 있는 그때 그 추억을 더듬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도해 본다.
고향마을 뒷동산 어(魚) 씨 선산에는 그들의 선조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매년 묘사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이날은 동네 어린이들의 잔칫날이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곳으로 달려가 ‘묘사떡’을 나눠 줄 때까지 나란히 줄을 맞춰 앉아 기다렸다. 시루떡 한두 조각 받아서 집으로 달려가 동생들과 나눠먹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때는 날씨마저 추워서 소매로 콧물을 훔치던 동심의 추억이 그래도 그리움으로 남는다. 아마 그 당시는
못 입고 못 먹어서 더 추위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소문을 듣고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들 때는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일찌감치 동이 나서 빈손으로 돌아설 때도 있었다. 심지어 몰려드는 아이들을 피해 하교(下校) 전에 제사를 마치기도 해 부리나케 쫓아가도, 헛걸음을 했다. 어느 때는 이웃 동네 묘사에 원정(?)을 간 적도 있다. 부모님 몰래 다녔지만, 들키는 날에는 야단을 맞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아픈 가슴을 헤아리지 못한 철부지였다. 요즘은 먹을거리가 지천이지만, 당시는 최고의 군것질이었으며, 꿀맛이었다.
그 당시의 일기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소중한 추억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그 가치를 미처 생각지 못한 어머니께서 제대로 챙겨 두지 않아 잃어버린 것이다. 일기장은 국민학교(초등학교) 저학년 때 방과 후 숙제로 일기를 써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아버지께서 종이를 모아 공책을 매어 주셔서 일기를 작성한 기억도 있다. 의무적으로 쓴 일기장이지만, 당시의 추억이라 온 집안을 뒤져 찾아 헤맸었다.
일기장 분실 사건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59세) 후 어머니께서 서울로 떠나시면서 비롯됐다. 맞벌이하던 동생 아기를 돌봐줘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자녀들도 직장이나 출가로 고향을 떠나버린 뒤라 슬레이트 지붕인 토담집은 빈집으로 남아 폐가가 되다시피 방치됐다. 10여 년이 흐른 후 고향을 잊지 못한 어머니께서 귀향을 원해 토담집을 헐고 새집을 지어 드렸다. 서울로 이주할 당시 안방 장롱에 보관해둔 짐들은 찾아 당신 혼자 정리하셨다. 그때 빛바랜 낡은 일기장은 쓰레기로 분류된 것으로 추리할 뿐 찾을 도리가 없었다. 일기장뿐만 아니라 그리움이 담긴 편지와 반추할 수 있는 글들을 모은 노트들도 모두 그때 사라졌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당시는 만만찮은 직장 생활로 추억을 돌이켜볼 여유가 없었다. 나중에서야 생각나서 허겁지겁 찾았을 때는 폐지들과 함께 몽땅 소각했다는 어머니의 무심한 대답만 들었다.
요즘은 태아 때부터 자녀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고 기념품으로 보관한다. 기록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귀금속보다 더 보물로 여긴다. 물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처럼 역사가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아는 이들은 더욱 그렇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치만 논하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주의다. 지나친 이기주의가 가져온 세태지만, 인생관은 자신의 것이라 탓할 수는 없다. 사진 한 장, 갈겨 쓴 메모 한 줄이라도 추억으로 간직하면 훌륭한 회고록이 될 것이며, 나의 역사가 된다. 나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속된 우리의 역사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SNS 시대는 기록 보존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더욱 편리하게 소장할 수 있다. 사소한 일상이라도 역사를 위해 기록해 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