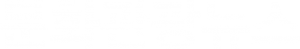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도 이제야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마스크에 갇혀 산 지도 어언 15개월이 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일상을 소화하면서 겪는 불안과 긴장감은 더욱 가중되고, 우리는 한 치의 앞을 예측하지 못한 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주춤거리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스컴에 등장한 전문가들은 연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그에 대응할 채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블루로 갈피를 못 잡는 숱한 사람들은 천재(天災)라고 생각하며 운명에다 내일을 맡기고 있다.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다. 주말마다 불려 다니던 청첩장이나 초대장이 오히려 반가울 지경이다.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되고, 5월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가정의 달을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신이 내린 기회라고도 한다. 하기야 이런 사태가 아니라면 가정의 달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公私)에 분주한 사람들은 늘 가족에게 미안함을 가지며 쫓겨 다닐 것이다. 이들에게는 코로나가 오히려 여가를 만들어준 셈이다. 여하튼 계절의 여왕 5월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도록 설계하는 건 자신들의 몫이다. 코로나 핑계로 ‘방콕’을 하든지, 아니면 싱그러움의 유혹 속으로 뛰쳐나가야 할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에 한 번쯤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도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 같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보낸 일과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무심코 창밖으로 던진 시선이 텃밭에 멈췄다. 이제야 잊고 지냈던 5월 파종이 생각났다. 지금까지 아내가 심어놓은 고추나 깻잎 등을 따먹으면서도 그에 따른 수고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 집 텃밭은 정원을 갈아엎어 조성한 작은 공간이다. 소싯적에 예쁘게 가꾼 정원이 부러워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마당에다 정원수와 꽃나무도 심고 잔디밭도 가꿔 제법 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따스한 봄날 휴일에는 목련, 진달래, 철쭉, 상사화가 만개한 잔디밭에서 파라솔을 펼치고 차 한 잔 마신 그 추억들은 지금 상상해도 행복하다.
하지만 봄날의 향유는 길지 못했다. 잡초가 생명력을 과시하듯 곳곳에 무성해지고, 벌레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驚氣)를 일으킬 정도여서, 차츰 회피 장소로 변해갔다. 살충제를 살포하고 싶어도 독성 때문에 가족 건강과 이웃의 피해가 우려돼 사용할 수가 없었다. 특히 한창때라 가정보다는 직장이 우선이었고, 자기 계발의 시간이 부족해 쩔쩔매는 실정이라 잡초 뽑을 여유가 없었다. 결국 잔디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자연 그대로가 좋다며 자위(自慰) 하는 지경이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도 이제야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아내와 의논 끝에 잡초밭으로 변한 잔디를 갈아엎기로 했다.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에다 짬나는 대로 어릴 적 기억을 더듬고 이웃의 조언을 얻어 상추씨를 뿌리고 한두 포기의 고추를 심기 시작했다.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텃밭은 아내의 몫이었다. 우리 부부는 농부의 아들딸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터라 이웃의 자문과 체험으로만 농법을 터득해 나간 것이다. 이제 아내는 나와 아이들에게 농법을 가르칠 정도로 수준급(?)이다.
올해는 고추 모종 80포기와 가지 10포기, 오이,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품종을 한두 포기씩 심었다. 아내 곁에서 고추 지지대를 세워 주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또 하나의 작은 행복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