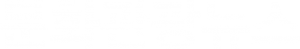영화 ‘리틀포레스트’는 지루하고 시시한 영화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한껏 풀이 죽은 취업준비생이 고향 시골집에 내려가 먹거리를 제 손으로 마련해 요리를 하고, 남은 시간에 친구들과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영화의 중심 이야기다. 갈등이나 반전, 이렇다 할 사건조차 없다. 영화는 계절과 함께 자연의 리듬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집중할 뿐이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런 단조로운 영화에서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 리틀포레스트에서 엄마가 여주인공에게 남긴 편지내용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위로와 공감을 얻었다. 영화 ‘리틀포레스트’의 제목처럼 ‘작은 숲’의 ‘치유’를 받는 듯 삶을 살아가는 데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위로를 얻은 건 아닐까.
주위를 둘러보면 지난 몇 년간 시골로 귀농하기, 떨어진 가족들과 모여 땅콩집 지어 살기, 도심 속 텃밭 가꾸기 등 획일적인 생활이 아닌 다양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JTBC ‘효리네 민박’에서는 직접 재배한 채소로 신선한 식단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손님들을 초대해 저녁 시간을 함께하고 바닷길을 산책하는 모습에서 많은 도시인의 로망이 됐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유로운 삶 ‘킨포크 라이프’
여유로운 삶 ‘킨포크 라이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회현상처럼 유행했던 라이프 스타일, 웰빙·힐링·미니멀리즘, 최근에는 미국에서 건너온 ‘킨포크 라이프’(kinfolk life)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킨포크 라이프는 미국 포틀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잡지인 ‘킨포크’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 진화적이고 소박한 기쁨을 추구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포틀랜드 지역 주민인 네이선 윌리엄스와 케이티 설 윌리엄스 부부가 동네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일상을 수록하는 내용의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작가·농부·사진작가·요리사·화가·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했다.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은 끌려가는 듯한 일상에서 내려와 주위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 함께 걷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생활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주부 민정희(36) 씨는 1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다.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만큼은 자유롭게 놀고 가족들과 유대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됐다”며 시골라이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녀는 “아파트에 살 때는 이웃들과의 정이 사실 부족했고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심스러웠다. 이곳에 오면서 직접 기른 채소와 삶을 이웃들과 공유하면서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 졌다”며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 아이들도 함께 밝아진 거 같다”고 말했다.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사는 일상을 지향하게 됐다. ‘킨포크’ 이전에 우리 삶에 스며들었던 ‘북유럽 생활방식(인테리어, 패션, 감성)’ 역시 슬로 라이프(Slow life)를 기반으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한다. 그중에서도 스웨덴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즐기며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삶을 산다. 오늘을 수고한 나에게 선사하는 쉼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에서 벗어나 가까이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현재 한국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킨포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유기농 제품 판매, 친환경 밥상 등 가치 지향적 소비문화가 킨포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개성을 존중하는 스몰웨딩, 셀프 인테리어 등도 킨포크 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바쁘고 지루한 일상을 탈출해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지인들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도 킨포크 현상이다. 행복을 위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작은 규모의 소형 텃밭을 가꾸며 직접 키운 채소들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족,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시골로 가는 건 아직 망설여진다는 직장인 김학경(38) 씨는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며 “아이들이 다 크면 형 내외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농사지으며 살기로 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되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도 먹이고 싶고, 체험도 하게 해 주고 싶어 주말농장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다. 자신의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과 화목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답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의 기준이 되는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안다.
‘킨포크 라이프’는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다. 소박한 삶 속에서 오는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식사를 쉬는 날 이웃,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이 킨포크 라이프가 아닐까.
황정윤 기자 hj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