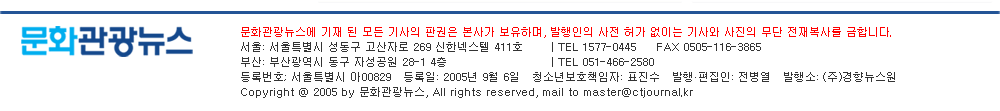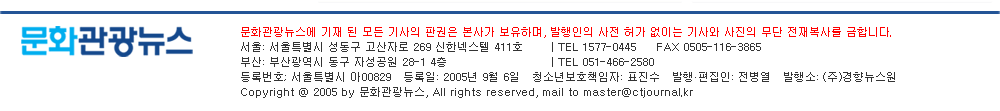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여행의 즐거움
여행을 잘 다니는 편이 아니었다. 여행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르다는 알랭 드 보통 씨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경험한 여행의 현실은 이러했다. 낯선 장소와 무뚝뚝한 사람들, 입 설은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 바가지요금 등등. 사람들이 감탄을 쏟아내는 절경 앞에서도 나는 무감했다. 팔짱을 낀 채 텔레비전에서 보던 거랑 똑같구만 왜 저래 설레발이야, 라는 표정을 짓곤 했다. 그건 정말 밥맛, 술맛, 여행 맛 떨어지는 짓이라 아니 말할 수 없으므로, 나와 동행 했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의 전한다. 다만 밥맛, 술맛은 알아도 여행 맛은 모르던 소싯적의 일이니 다들 이제 그만 잊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삐뚤어진 성격 탓도 있겠지만, 첫날밤 신랑의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를 목격한 신부처럼 여행의 기대를 압도하는 현실의 민낯 앞에서 나는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에어컨 바람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나 보고 한우전문점에서 소갈비나 뜯을 걸. 여행을 하는 내내 내 안의 악마는 그렇게 속삭였다.
내가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려 한다고 말했을 때, 지리산 자락 아래에 사는 후배는 종말의 예언이라도 들은 것 마냥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지만 나 스스로도 좀 의문이었다. 거긴 걸어서 뭐하려고? 소싯적의 내가 묻는다면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날의 일출과 일몰 시간, 햇빛의 세기와 달의 기울기,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질감, 방의 온도와 습도, 저녁으로 먹었던 된장찌개의 염도와 갈치구이의 식감, 아내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뭔가 유사 과학 같은 답이 도출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왕 떠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이유 따위야 아무려면 어떠랴. 후배의 조언에 따라 아내와 나는 인월에서 금계로 향하는 지리산 둘레길 3코스를 걷기로 했다. 힘들지 않을까? 떠날 채비를 차리며 아내는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걱정했다. 나는 제주 올레길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지난 봄 제주 올레길을 걸었을 리 없지만, 올레길 둘레길 라임도 맞고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다. 둘레길이니까 산 주위 낮은 지대를 빙빙 둘러가겠지, 좀 긴 산책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당시 내가 기대한 여행의 현실이었다.
보통 씨께서 천명하셨다시피, 여행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르기 마련이다. 인월에서 출발해 한 시간 남짓 걸어 문제의 갈림길에 당도하기 전까지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산으로 들어가는 언덕길과 낮은 경사의 내리막길 중 어디로 가야할지도 몰랐다. 우리는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마을주민에게 길을 물었다. 두 길 다 둘레길이요. 이쪽은 좀 힘든 길이고 저쪽은 좀 편한 길이고. 잠시 고민 끝에 우리는 언덕길을 택했다. 인월에서 출발해 한 시간 남짓 걸어 온 길에 비춰보면 좀 힘들다는 이 언덕길도 뒷동산에 오르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다. 발걸음도 가벼웁게 우리는 언덕길을 올랐다. 그렇게 십여 분쯤 언덕길을 오르고 나니 다른 언덕길이 나왔다. 이 정도야 뭐. 다른 언덕길을 열심히 오르고 나니 또 다른 언덕길이 얼굴을 내밀었다. 제법……헉헉……높네. 또 다른 언덕길을 열심히 오르고 나니 또 또 다른 언덕길이 나왔다. 헉헉헉헉헉헉헉헉. 점점 더 가팔라지는 언덕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오려던 어떤 말을 꾹꾹 삼켰다. 설마……. 우리의 대화는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그저 눈앞의 길을 묵묵히 걷기만 했다.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탄한 길과 이어져 있을 것 같았던 산길은 자꾸만 더 깊은 산 속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름이 둘레길이건만, 길은 너무 높고 너무 좁았다. 그리고 길 옆이 급경사라 너무 위험했다. 도대체 이 길이 무엇의 둘레란 말인가! 무엇보다 그 길을 오가는 사람이 우리 밖에 없었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걸었다. 아마 그 길이 옹색하나마 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결국 사람들에게 이어질 거란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되돌아가자니 이제껏 고생고생하며 걸어 온 게 너무 억울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돌아가는 것보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무턱대고 믿었는지도. 어쨌든 길은 우리가 가지 않은, 좀 더 편하다는 그 길과 다시 이어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을 빠져나오는 우리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람들의 인사에 쭈뼛거리기만 하던 우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아 우리는 한동안 휴식을 취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힘들고 험한 산길을 무사히 걸어온 것이 좋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았다. 땀에 찌든 옷과 지친 몸도 좋았고, 아직 걸어야할 길이 남았다는 것도 좋았다. 나무와 햇빛과 새 소리와 벌레도 좋았고, 한 잔에 이천 원하는 막걸리도 좋았다. 나는 떠나기 전 상상했던 여행지의 이미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여행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당연히 다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행의 기대란 여행지에서 무참히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기대 앞에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자. 그 빈자리는 기대에 가려졌던 여행지의 진짜 모습이 분명히 채워줄 테니까.
글 · 여행작가_황경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