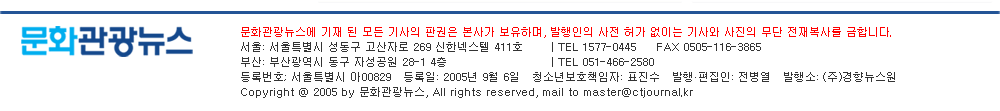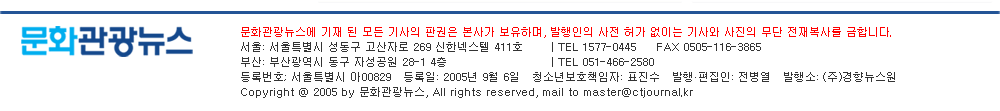현대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불러온 정보사회는 기술 발달만큼 급격한 사회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부가된 뉴미디어에 의해 그 위상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정보 생산 체계도 대중매체의 전문가에서 정보 소비자, 즉 독자나 시청자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수동적으로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달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디어 시스템이었다면 정보사회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피드백한다. 때로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새롭게 가공하고 첨삭해서 유통한다.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스마트 미디어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스마트폰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이 탑재되면서 대안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체험담을 현장사진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올려 전파시키기도 하고 재난과 사건 ? 사고 등 화제의 뉴스들이 스마트 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사안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생각들이 공적인 의사로 일파만파 확산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개발이 인간 세상을 SNS 천국으로 만든다. 이젠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도구가 됐다. 하지만 마냥 즐기는 유토피아적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SNS를 통한 세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만들어진 세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실인 양 믿으려 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간다. 가상세계는 간혹 현실과 혼동을 일으키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사실을 허위 ? 왜곡 ? 과장하며 여론을 형성시킨다. SNS가 사상의 공개시장으로 진리를 얻기 위한 광장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위한 인터넷 여론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도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불만스런 표현이 동조자를 만나고 여론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빚어지는 찬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유가족들의 진의를 날조하거나 왜곡ㆍ과장한 메시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 유포되고 있다.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진실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SNS 세상에서 만들어진 진실은 보상이나 의사자 대우, 특례 입학 등등 특혜를 노리고 벌이는 이벤트라는 것이다. 게다가 기성 미디어까지 이를 의제로 설정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유언비어나 위화감을 조장하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은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익명성에 숨어서 유포된 검증되지 않은 SNS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는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마치 사실인 양 전파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SNS는 멈추지 않는다. 사실을 검증할 제도적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 때로는 익명으로 절대적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그러나 나만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상대적인 자유이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스마트폰이 만드는 세상은 인간성마저 상실시킨다.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스마트폰으로 함몰되고 오직 그곳에서만 소통의 장이 열린다. 부모ㆍ형제도 스마트폰 메시지로 만나고, 바로 곁에 있는 지인에게까지 문자를 통해 대화한다.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친목회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밥상머리에서까지 스마트폰을 두드린다. 이들은 대면적 인간관계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여긴다.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과 SNS에 매달려 일상을 보내려 한다. 이러다간 정서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스마트폰 세상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인간관계만 남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의 맹점이 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의 폐회를 이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글 I 전병열 본지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