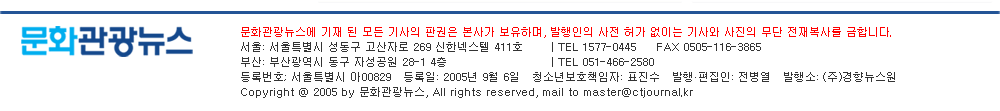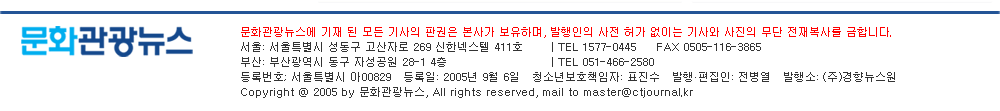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우리 강은 아름다운 비경, 역사·문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강은 아름다운 비경, 역사·문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떼돈 번다’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목숨을 걸고 여울을 헤치던 뗏목꾼의 그래질 대신 지금은 래프팅을 즐기는 동강의 물길 따라 흐르는 ‘뗏목질해서 떼돈 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고란사에서의 풋풋한 추억’에서는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은 백제여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건립된 고란사를 배경으로 인터넷을 통해 옛사랑을 찾는 애틋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동소주의 향기를 통해 연이의 소원을 듣다’에서는 안동 제비원 석불에 얽힌 연이처녀의 전설이 현시대 남녀의 러브스토리와 연결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21세기 소년 홍길동의 이야기’, ‘웃음 많은 호랑이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강, 이야기를 품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강을 비롯한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발굴되고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 관광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여러분에게 강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강둑 위를 내달려 학교에 가는 아이들, 한가로이 강가에 메인 나룻배, 강물을 퍼 올려 키워낸 푸른 들판에도 강은 소중하고 귀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강이 있어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 위에서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이라서 마음을 편히 누인 시간이었습니다. 강이 있기에. 강이 있기에. 둥지처럼 품어주는 강이 있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물결 속에 넉넉히 자리합니다.
흘러도 늘 같은, 그 길에 언제나 새로운, 강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선물입니다.
동강 3代, 지금은 변한 동강의 모습
 “이번 주에 좀 내려와야겠다.” “이번 주에 좀 내려와야겠다.”
늘 이런 식이다.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애당초 상대의 대답을 바라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에 또 쪼르르 내려가는 나도 바보 등신이다. 그런데 안 내려가면 또 어쩔 건가.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 혼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민박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 초 신정(新正)을 새고는 며칠 안 되어 짐을 싸 서울로 향했다. 입학 즈음에 올라가면 되지 미리 가 방값만 축낸다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짜증스럽게 받아치고는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 언제부터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가. 영월 깡촌에서 아침저녁으로 부지런을 떠는 아버지도 동강도 동강상회도 모두 싫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둥 살 둥 공부에 매달렸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만이 되도록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머리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어서 언제나 결과가 좋았다.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한 달 전쯤 종강을 했는데도 내려갈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며칠 전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만 아니었어도 어쩌면 이번 여름을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넘겨버렸을지도 모른다.
안채는 큰 방 하나에 작은 방이 두 개로 민박집으로 쓰고 바깥채는 작은 방이 하나 딸린 상점. 그곳이 내가 나고 자란 동강상회다. 동강상회가 그곳에 있은 지는 아주 오래되었다. 내가 나기도 전부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안채는 민박집이 아니라 그냥 세를 주어 주로 탄광촌 인부들이 살곤 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영월을 떠나가면서 민박집으로 변했다. 몇 년 전부터는 래프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민박 장사도 꽤 할 만해졌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는 싫었다. 무리 지어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놀다 갈 리 만무했고, 도시에서 왔다는 꼴값으로 모양을 부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래프팅만 해도 그렇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다녔을 그 물길이 그들에겐 한낱 놀이거리에 불과해진 것이다.
할아버진 팔당에 댐이 들어서면서 뗏목일을 그만두셨지만 그전까진 20년이 넘게 뗏목일을 하셨던 우리나라 마지막 뗏목꾼이시다. 난 할아버지의 거칠고 무뚝뚝한 손을 무척 좋아한다. 그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시며 “원준아”하고 부르는 순간이 아득하게 좋았다. 나는 어릴 적 열이 자주 오르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면 할아버진 늦도록 내 머리맡에서 부채질을 해주시며 나지막하게 아라리 소리를 들려주셨다. 그러면 온몸에 지르르 퍼진 미열도 그만 가라앉는 듯했다.
그렇게 시작된 옛이야기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모기향이 영월 밤 공기를 타고 흐르며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익숙한 풍경이 낯설어지고 귓전에서 왕왕대던 풀벌레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만다. 이게 영월의 여름이다. 사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득함.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모기향이 영월 밤 공기를 타고 흐르며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익숙한 풍경이 낯설어지고 귓전에서 왕왕대던 풀벌레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만다. 이게 영월의 여름이다. 사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득함.
“야, 아까 급류 탈 때 기분 죽이지 않았냐?”
아스라이 출렁이던 달콤한 공기가 깨졌다. 안채에는 오늘 낮에 민박을 하러 온 무리가 래프팅을 마치고 난장을 치고 있었다.
자꾸만 울화가 밀려왔다. 남자 둘 여자 둘이 아까부터 안채 평상에서 한바탕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모양새를 보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모르는 척 지나치고 말 것을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무렇게나 침을 뱉고 시끄럽게 노는 꼴이 거슬려 계속 성난 염소 같은 얼굴로 쳐다봤다. 그새 혀가 굳어가는 소리로 이죽거리는 꼴을 보니 괜스레 부아가 치밀었다.
“겨우 그걸 타고, 꼴값은.”
“뭐야? 어이, 거기 나 보고 한 말이야?”
“귀는 밝네.”
술기운이 뻗친 남자가 단번에 내 멱살을 잡았다. 훅 내뱉는 술 냄새에 나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화가 치민 남자가 뾰족하게 한마디를 뱉었다.
“깡촌에서 민박이나 하는 주제에.”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끌었다. 할아버지였다. 맥 빠진 한숨이 입에서 새어 나왔다. 할아버진 남자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꾸만 눈 끝에 빗물 같은 것이 맺혔다. 아버지가 동강상회로 들어선 것도 그쯤이었다.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에게 열심히 허리를 굽히고 내가 그 옆에서 멀뚱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즈음.
“무슨 짓이야! 아버지 동강축제 때문에 바빠서 할아버지 도와 일 좀 하랬더니,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집에 들어설 때부터 부은 얼굴이더니 이러려고 온 거냐?”
“아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깡촌이랍니다. 깡촌에서 백날 축제해봐야, 깡촌축제 밖에 더 돼요?”
“뭐, 이놈아? 대체 너 언제 철들 거냐?”
입술을 질끈 씹으며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결단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영월이, 동강이, 동강상회가 깡촌의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도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말이지 남들 입에서 듣고 싶진 않았다. 도시 사람들에게선 더욱. 내 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이 되고 말 것 같아서 언제나 두려웠다.
 새까만 동강을 보고 있자 더 우울해졌다. 막걸리 한 병을 들고서 할아버지가 곁에 와 앉으셨다. 꼴꼴, 사발에 막걸 리가 채워졌다. 할아버진 한참을 말없이 사발만 비우셨다. 그 사이 내 마음도 차츰 비워졌다. 그리고 또 한참. 새까만 동강을 보고 있자 더 우울해졌다. 막걸리 한 병을 들고서 할아버지가 곁에 와 앉으셨다. 꼴꼴, 사발에 막걸 리가 채워졌다. 할아버진 한참을 말없이 사발만 비우셨다. 그 사이 내 마음도 차츰 비워졌다. 그리고 또 한참.
“장관이었지. 10여 대가 넘는 떼가 강을 헤치는 모습이……. 거친 여울을 죽을힘을 다해 헤치고 나면 그때부턴 여유가 조금씩 생겼지. 그러다 나루에 가까워져 오면 색주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들곤 했다.”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문득 궁금해졌다. 수십 년 전 저 동강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켰다.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갈 것만 같은 막걸리의 달큼한 끝 맛에 뒤통수가 은근히 달아올랐다. 할아버지의 아라리 노랫가락이 동강 위를 둥둥 떠다녔다.<다음 호에 계속>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기획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