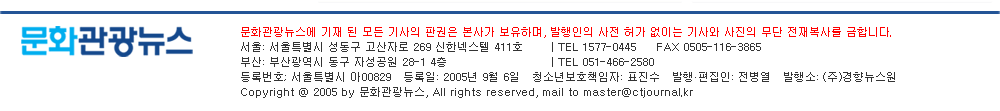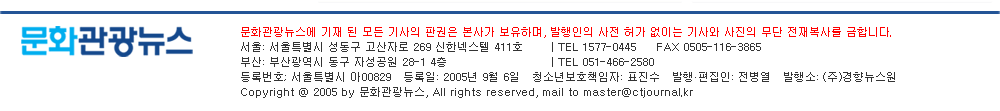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원래 ‘퇴계오솔길’은 ‘퇴계녀년길’이라 전해오는데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즐겨 찾던 길이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른 퇴계는 여러 관직을 거친 뒤 쉰아홉 살이 되던 해(1560)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에 열중하는 한편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원래 ‘퇴계오솔길’은 ‘퇴계녀년길’이라 전해오는데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즐겨 찾던 길이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른 퇴계는 여러 관직을 거친 뒤 쉰아홉 살이 되던 해(1560)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에 열중하는 한편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때 퇴계는 이웃한 봉화 청량산을 즐겨 찾았는데 도산서당에서 낙동강을 따라 청량산을 오갔던 이 길을 퇴계가 걷던 옛길이라고 해서 ‘퇴계녀년길’이라고 한다.
낙동강을 따라 흘러가는 ‘퇴계오솔길’을 따라 겨울바람과 함께 흘러가보자.
퇴계의 흔적을 따라
 안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67번 버스에 몸을 싣고 40분가량을 달리면 ‘한국정신문화의 성지’인 도산서원에 도착하게 된다. 안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67번 버스에 몸을 싣고 40분가량을 달리면 ‘한국정신문화의 성지’인 도산서원에 도착하게 된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지어진 서원으로 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건축물 구성으로 볼 때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몸소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퇴계가 숨진 뒤 건립돼 추증된 사당과 서원이다.
도산서당은 1561년(명종 16)에 설립됐다. 퇴계의 낙향 후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지었으며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가 직접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의 하고직사도 함께 지어졌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됐다.
 1969년 서원을 중심으로 임야 및 전답 19필 324.945㎡가 사적 170호로 지정됐고 197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보수·증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유학사상의 정신적 고향으로 성역화됐다. 1969년 서원을 중심으로 임야 및 전답 19필 324.945㎡가 사적 170호로 지정됐고 197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보수·증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유학사상의 정신적 고향으로 성역화됐다.
도산서원에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더듬어봤다면 퇴계종택을 가보지 않을 수 없다. 도산서원 주차장에서 200m쯤 올라간 고갯길 첫 번째 주차장 길옆으로 난 산길을 이용해 2㎞ 정도 걸어가면 퇴계종택을 만나게 된다.
퇴계종택은 퇴계의 종가로 원래 있던 집은 없어지고 현재 있는 건물은 1926∼1929년 사이에 선생의 13대손 하정 공이 옛 가옥의 규모를 따라 새로 지었다. 앞면 6칸·옆면 5칸 규모의 ‘ㅁ’ 자형 집으로 총 34칸으로 이루어졌다. 높은 석축 위에 둥근 기둥과 네모난 기둥을 사용했으며 전면에 솟을대문을 갖추었다. 오른쪽에 있는 ‘추월한수정’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정자인데 마루에는 ‘도학연원방’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퇴계종택을 둘러본 후 인근에 퇴계가 고이 잠들어 있는 퇴계묘소로 발걸음을 옮겨 소박하고도 양지바른 곳에 아담히 자리한 퇴계의 묘에서 그가 추구했던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문화
 퇴계묘소에서 아스팔트 길을 따라 1㎞가량 떨어진 곳에는 민족시인이자 저항시인인 이육사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 의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이곳을 둘러본 뒤 낙동강 방향으로 약 2㎞ 걸음을 옮기면 낙동강을 만나게 된다. 퇴계묘소에서 아스팔트 길을 따라 1㎞가량 떨어진 곳에는 민족시인이자 저항시인인 이육사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 의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이곳을 둘러본 뒤 낙동강 방향으로 약 2㎞ 걸음을 옮기면 낙동강을 만나게 된다.
낙동강을 따라, 퇴계가 걸었던 길을 따라 여유롭게 걷는 걸음걸음은 시간의 흐름마저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걸음은 사색이고 걸음은 자유다. 퇴계의 걸음에도, 우리의 걸음에도 담긴 시간은 낙동강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강변을 따라 4.5㎞가량 걸으면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얼이 서려 있는 ‘농암종택’을 마주하게 된다.
농암종택을 지나 다시 낙동강을 따라 2㎞ 걸어가면 퇴계의 제자였던 금난수가 지은 누각 고산정에 오르게 된다. 이곳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며, 퇴계가 걸었던 길을 다시 되짚어보며 ‘퇴계오솔길’에서 담아온 나만의 기억과 상념을 새겨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