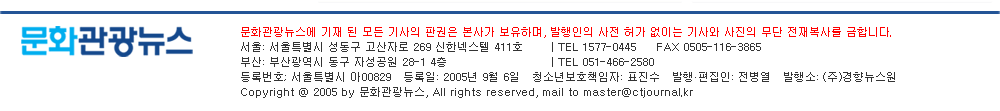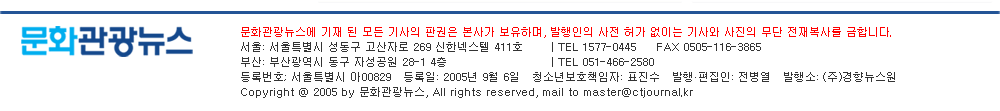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예로부터 백사청송으로 알려진 하동.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새하얀 모래와 사계절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바로 하동의 풍경이다. 재치잡이로도 유명한 하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백사청송만큼이나 알알이 숨어 있는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예로부터 백사청송으로 알려진 하동.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새하얀 모래와 사계절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바로 하동의 풍경이다. 재치잡이로도 유명한 하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백사청송만큼이나 알알이 숨어 있는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동군청 김성채 학예연구사는 “하동군민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내기 위해 삶과 투쟁을 하며 살아간다”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하동의 설화는 그러한 투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하동을 많이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섬진강에 나타난 도술 해적
영원한 마음의 고향 ‘섬진강’은 예로부터 고운 모래가 많아 가람, 사천, 사수천, 다사강으로 불려지며, 고려 초에는 두치강으로 널리 불렸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섬진강이란 명칭이 정해진 시기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 민족을 위기로부터 지켜냈던 두꺼비 전설에서 비롯된다.
고려 말, 임진왜란은 한반도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마냥 평화롭기만 했던 섬진강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왜군은 총성을 높게 울리며 섬진강을 타고 올라왔고, 주민들은 왜구의 함선이 서서히 가까워지자 불안감에 떨며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서둘렀다.
이윽고 왜적의 병선 하동읍 건너 강가에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고향을 버린 채 피난길에 오르려는 찰나, 갑자기 두꺼비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퍼져 나갔다. 광양군 진상면 삼거리에 떼를 지어 살던 두꺼비 떼가 마치 왜적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까맣게 몰려와 울부짖었던 것이다. 두꺼비 떼의 모습은 마치 만리장성과 같았고, 그 기세에 눌린 왜적들은 감히 상륙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물러나고야 말았다.
두꺼비 떼의 도움으로 고향을 지켜낸 사람들은 그 후 두치강을 두꺼비 ‘섬(蟾)’자를 따서 섬진강이라 부르게 됐다. 지금도 하동읍 강 건너 섬진 나루 앞에는 수월정이라는 정자와 두꺼비 석상 4기가 놓여 하동을 지켜가고 있다.
임진왜란이 지나간 후 섬진강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이후 파수꾼처럼 지키고선 두꺼비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섬진강은 사계절 흥성한 뱃길이 열렸다. 아침저녁 쉴 새 없이 배가 드나들었고, 물자도 언제나 풍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을 들은 해적 떼들이 언제부턴가 섬진강에 출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도술을 부리며 신출귀몰하는 해적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포도청은 해적들을 소탕하려고 온갖 방안을 모색했지만 매번 헛수고였다. ‘이번에야말로 잡았겠거니 하면 해적은 후다닥 옷을 벗은 채 새가 되어 날아가거나 물고기로 변신해 유유히 섬진강을 따라 도망치고야 말았다.
포도청은 물론 이러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비록 해적이긴 하지만 ‘그놈 참 용하다!’며 해적질을 해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포졸이 도술을 부리는 해적을 반드시 잡고 말겠다며 섬진강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다 잠시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다. 포졸은 온종일 걷고 또 걸은 탓에 졸음이 몰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크게 하품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득 하품하던 포졸이 나뭇가지 위를 올려다보니 새의 목에 옷고름이 매여 있는 것이었다.
‘옳거니! 이놈 봐라, 네가 바로 그 도술 해적이겠다!’
포졸은 냉큼 손을 뻗어 새의 부리를 잡아 틀었다. 그러자 새는 이내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사람으로 변했다. 나무에 기대 놀던 해적이 갑자기 나타난 포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급히 새로 둔갑하려다 미처 옷고름을 풀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그렇게 애를 먹이던 해적은 한순간의 어이없는 실수로 붙잡히게 되었고, 다시는 하동포구 80리 뱃길에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귀신울음마저 잠재운 하동송림
 달빛마저 머물다 지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진강.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문인이나 학자들이 하동을 찾을 때마다 반드시 섬진강에 들러 시 한 수씩 읊을 만큼 사랑을 받아오던 곳이었다. 달빛마저 머물다 지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진강.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문인이나 학자들이 하동을 찾을 때마다 반드시 섬진강에 들러 시 한 수씩 읊을 만큼 사랑을 받아오던 곳이었다.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일두 정여창 선생은 김종직의 제자로 경학과 성리학을 연구했으며, 학식이 높고 행실이 단정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러한 정여창 선생도 아름다운 섬진강에 매혹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 선생은 1940년 하동으로 내려와 덕은사 경내의 악양정에서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했다. 그가 학문을 연구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섬진강으로 내려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흐트러진 심신을 다시금 바로 잡았다.
이처럼 수많은 문인과 학자를 매혹시킨 섬진강이지만, 간혹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처럼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바로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과 모래바람 때문이었다. 강바람은 하동을 따라 펼쳐진 대숲을 마구 뒤흔들며 마치 귀신울음소리와 같이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섬진강을 휩쓸고 나온 모래바람은 가축은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병들게 했다.
조선 영조 21년(1745)에 이르자 종종 불던 바람이 매일 밤마다 세차게 불어 닥쳤다. 당시 하동도호부사이던 전천상은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을 버리고 떠나가자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자 섬진강변을 따라 또 다시 귀신울음과 같이 음산한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천상은 서둘러 채비를 챙겨 섬진강으로 나갔다. 섬진강 변에 다다르자 심한 모래바람 탓에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든 지경이었다. 심지어 강변을 따라 꽃과 나무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나뒹굴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강바람을 어떻게 막는다는 말인가.”
전천상은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시름에 빠져들었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거세게 부는 바람에 갓끈이 풀려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는 갓을 쫓아 발길을 재촉했고, 이윽고 멀리 떨어진 작은 솔밭에 당도해서야 걸음을 멈출 수가 있었다. 그렇게도 무섭게 날아가던 갓이 솔밭 안으로 들어서자 망부석이라도 된 마냥 가만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천상은 갓을 주워들고 흐트러진 옷매무시를 고쳐 잡았다. 미친 듯이 날뛰던 강바람이 소나무 밭 앞에서 새색시처럼 얌전해져 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전천상은 섬진강 하구의 넓은 백사장을 따라 소나무 1500여 그루를 심었다. 현재 260년이 넘은 노송 750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2005년 2월)됐으며 바로 오늘날 광평리 일원의 하동송림이 바로 그곳이다.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번창하자 하루가 다르게 강바람은 잦아들었고, 더 이상 귀신울음소리도, 병으로 앓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집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다시금 하동으로 되돌아왔고, 마을은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