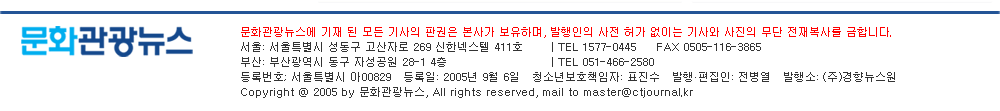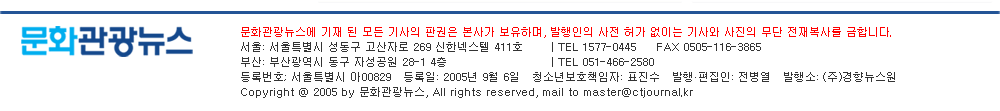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중국서는 쬐끔 간다고 하면 3시간이고 좀 간다고 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여기 한족처럼 잘 참아야만 백두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서는 쬐끔 간다고 하면 3시간이고 좀 간다고 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여기 한족처럼 잘 참아야만 백두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조선족 가이드는 이런 우스갯소리 하나로 중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넓은 나라인가를 설명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멀었다. 한반도 북쪽 끝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백두산은 남북이 가로 막힌 탓에 그곳에 오르려면 누구나 중국으로 건너가 기나긴 버스여행을 거쳐야만 된다. 통일이 되면 한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며칠이나 걸려 그것도 백두산, 아니 장백산을 오르는 것이다.
어쨌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 12일 항공편으로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인천과 서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중국대륙의 항구도시 다렌. 공항을 나서자마자 전세버스에 이끌려 5시간을 달려간 끝에 북녁땅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단동시(丹東市)에 여장을 풀었다.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13일 이른 아침부터 버스 안에서 4시간 반을 보내고서야 길림성 집안(集安)에 도착했다. 대충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숙소가 통화현(通化縣)이란 소도시의 3성급 호텔. 이날은 하루 종일 버스를 탔다는 기억밖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에 식사를 하고 6시30분에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호텔에서 백두산 서파 산문 입구까지 걸린 시간이 4시간. 군데군데 파손된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새 도로를 내는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지체되었으나 그래도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백두산 입구에 도착했다.
 중국인들이 ‘장백산 산문’으로 부르는 백두산 입구에서 무공해 버스로 갈아타고 정상을 향하는 도중 파랬던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고 있다. 조금 전까지도 하늘이 맑아 “오늘은 천지를 보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좋아했는데 백두산의 날씨는 역시 변화무쌍했다. 차창을 통해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며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 중국인들이 ‘장백산 산문’으로 부르는 백두산 입구에서 무공해 버스로 갈아타고 정상을 향하는 도중 파랬던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고 있다. 조금 전까지도 하늘이 맑아 “오늘은 천지를 보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좋아했는데 백두산의 날씨는 역시 변화무쌍했다. 차창을 통해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며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
“이러다가 백두산 천지를 못 보면 어쩌지…?” 함께 간 일행들이 웅성거리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백번 와서 두 번 볼 수 있다고 하여 백두산이라고 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백두산은 안개에 쌓여있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맑은 날의 천지를 보려면 삼대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명한 천지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셔틀버스는 굽이굽이 숲길을 날렵하게 헤치며 달려가고 있다. 좁은 아스팔트길 양쪽으론 가늘게 쪽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이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연녹색 숲길이 너무 이름답게 보여 차에서 내려 걷고 싶었다. 백두산 중턱에 가까이 이를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마침내 설악산 대피소 같은 건물이 있는 곳에서 셔틀버스가 멈췄다. 차량은 여기까지만 운행을 하고 천지 등정객들은 1천개도 훨씬 넘는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야만 천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부랴부랴 겉옷을 챙겨 입고 내리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진다. 다행히 비는 그친 것 같아 카메라와 배낭을 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빗방울이 멈추는 듯 했다.
천지로 향하는 돌계단 좌우에는 허리 높이의 눈이 켜켜이 쌓여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주 키가 낮아 지면에 붙은 파란색 꽃무더기가 듬성듬성 보여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느낌이라 신기하기만 하다. 이 눈은 7월이 되어야 녹아 이 언덕이 꽃천지를 이룬다고 한다. 아직 일러 들판을 수놓은 야생화를 보지 못해 내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인 5호경계비가 서있는 정상으로 가는 계단을 숨을 헐떡이며 쉬며가며 오른 지 40여분 만에 드디어 엄청난 넓이의 천지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혹시나 날씨가 심술을 부려 천지를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천지는 자신이 태고적부터 간직해온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천지의 물은 백두산 사진에서 보았던 코발트빛 물이 아니고 잔설과 얼음으로 덮여진 회색빛 모습이다.
민족의 영산이자 압록강의 발원지인 천지를 만났다는 벅찬 감격을 진정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나타내는 조그만 비 5호경계비 앞에 서니 ‘이곳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그리워하던 천지이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라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백두산 천지는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과 함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칼데라호이다. 수면의 해발 고도는 2189m나 되어 전 세계 화산호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백두산 천지는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과 함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칼데라호이다. 수면의 해발 고도는 2189m나 되어 전 세계 화산호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5호경계비로 오르는 계단은 한국인보다 중국 각지에서 관광 온 현지인들이 더 많아 보였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백두산이 아니다. 요즘 중국인들에게 각광받는 휴양지 장백산이다. 반대편 북한 영토 쪽에 혹 경비하는 군인이라도 보일까 한참을 살펴보았으나 메아리 없는 정막뿐이라서 가슴이 아려온다.
정상에 잠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칠어진다. 바람은 백두산 날씨에서 특별한 기상요소 중에 하나다. 백두산 기후가 변덕을 부리듯 바뀌고 겨울이 길고 추운 것도 모두 바람의 특성 때문이다. 백두산 정상부는 기온이 매우 낮은 이유로 여름철 2-3달을 뺀 나머지 달에는 눈과 강수량이 많고, 증발량이 매우 낮아 호수의 물이 쉽게 마르지 않는 것이다.
백두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2750m 높이의 장군봉이며 산의 윗부분에 부석이 덮여 있어 ‘白頭’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백두산에는 6월 말까지도 눈이 남아있고, 7월 중순까지도 그늘 일부분에는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화산 폭발의 특성으로 천지 아래까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둥산이라 서둘러 계단길을 역이용해 하산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하산길,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고 금강대협곡으로 향하는 길에 펼쳐지는 꽃밭은 알프스 초원을 무색케 할 정도로 광활한 초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장백제비꽃, 구름범의귀, 호범꼬리, 하늘매발톱 등 온갖 희귀한 고산 야생화들이 피고 지는 천상의 화원이라지만 아직 시기가 이른 탓에 아무 것도 보이질 않았다.
천지가 용암을 분출하며 만들어냈다는 대협곡은 길이만 15km가 넘는다. 골의 깊이는 80∼100m, 폭은 100∼200m나 된다. 발아래를 똑바로 내려 보기 어려울 만큼 경사가 절벽을 이룬다. 이름 그대로 V자 형상의 협곡이 굽이굽이 이어진다. 깊고 넓은 골짜기 곳곳에 기묘한 생김새의 바위들이 화산 폭발 직후의 모양 그대로 멈춰 있어 마치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넌을 연상케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