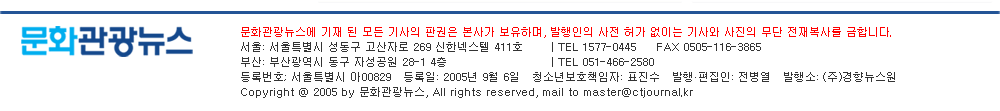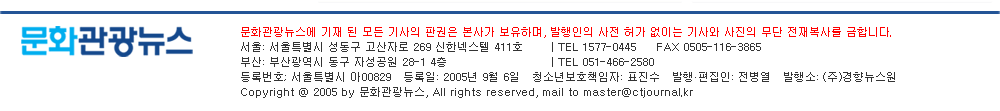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눈발이 휘날리던 날, 들을 지나 산을 넘어 도착한 그곳은 고향과 많이 닮아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반가운 얼굴이며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낯이 익다. 물 따라 내려온 산 냄새에 옛 동무가 떠오르고 바람 타고 온 된장 냄새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진다. 산허리마다 상념이 어려 있고 길 따라 오르던 논밭은 정겹다. 눈발이 휘날리던 날, 들을 지나 산을 넘어 도착한 그곳은 고향과 많이 닮아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반가운 얼굴이며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낯이 익다. 물 따라 내려온 산 냄새에 옛 동무가 떠오르고 바람 타고 온 된장 냄새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진다. 산허리마다 상념이 어려 있고 길 따라 오르던 논밭은 정겹다.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 일상의 때에 찌든 옷은 잠시 벗어두고 따뜻한 외투와 가벼운 봄옷 한 벌씩 챙겨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평창으로 한번 떠나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걸음마다 자연과 하나 됨을 느끼고 심호흡 한 번이면 막힌 가슴이 씻길 것이다.
오대산은 소박한 아름다움이다
 평창의 머리에 앉아 관내를 굽어보는 오대산은 아름드리 전나무로 빼곡하다. 주위를 에둘러 싼 봉우리들은 하늘과 구분 지음이 무의미하다. 봄이 오기 전, 눈꽃이 가득 피어난 전나무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은 기대감에 설레 들뜬 아이처럼 가볍다. 평창의 머리에 앉아 관내를 굽어보는 오대산은 아름드리 전나무로 빼곡하다. 주위를 에둘러 싼 봉우리들은 하늘과 구분 지음이 무의미하다. 봄이 오기 전, 눈꽃이 가득 피어난 전나무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은 기대감에 설레 들뜬 아이처럼 가볍다.
방아다리 약수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약 300m의 전나무 숲길. ‘연인의 숲’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걷고 싶은 길이다. 숲은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지만, 봄·여름·가을·겨울의 표정은 모두 온화하게 보인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오르면 혀끝이 짜릿한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방아다리 약수를 맛볼 수 있다. 고개를 젖히며 약수를 한껏 들이켜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청명한 하늘도 맛보게 된다.
월정사로 향하는 입구의 다리를 지나면 다시 천 년의 숨결을 간직한 전나무 숲이 길 양옆으로 800m나 줄지어 찾아온 길손을 맞이한다. 장쾌하게 뻗은 전나무와 푸른 침엽수림이 한데 어울린 이 숲길은 햇빛마저 흩어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낸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 오대산의 중심인 월정사에 올라보자. 이곳은 사시사철 등산객과 관광객으로 붐빌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월정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오대산 비로봉 밑에 적멸보궁을 창건하고 세운 절로 경내에는 ‘천왕문’과 ‘범종루’를 비롯해 ‘적광전’, ‘무량수전’, ‘삼성각’ 등이 있다.
문학과 예술의 향을 지닌 ‘메밀꽃’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근대문학의 선구자 가산 이효석 선생의 고향이자 그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평창 봉평면.
‘효석문학관’에 들러 작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보자. 이곳의 ‘이효석 문학 전시실’은 그가 걸어온 삶과 문학세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또 문학교실과 학예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문학을 체험할 수 있다. 폐교의 갈림길에 섰던 무이초등학교는 예술인들의 뜻이 모여 ‘무이 예술관’으로 새로 태어났다.
정문에 서면 그 위에 얹힌 커다란 날개의 구조물이 눈 덮인 산 위로, 맑은 겨울 하늘 위로 날아갈 것만 같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수십 점의 조각품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담한 산책로를 따라 아이의 마음으로, 자연의 마음으로 예술품을 느껴보자.
교실에는 도자기와 서예·그림이 가득하다. 예술관에 들어서면 흐드러진 메밀꽃 그림이 양옆에서 반겨준다. 직접 도자기를 빚어 볼 수 있는 도예실, 30여 년간 메밀꽃만 그려온 정연서 화백의 작품들로 가득한 그림전시실, 향긋한 먹 냄새가 가득한 이천섭 서예가의 서예전시실, ‘메밀꽃 필 무렵’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림전시실 등 학교의 곳곳에서 예술과 문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군에서는 봉평면 일대에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길을 재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 하니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또 효석문화제와 연계해 메밀을 이용한 음식의 홍보와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하니 곧 ‘소금이 뿌려진 듯한 산허리 메밀밭’에 앉아 평창만의 메밀 음식을 맛보는 것도 기대해봄직 하다.
상상 속에 자리한 양떼 목장의 풍경
 ‘대관령 양떼 목장’. 구 대관령 휴게소 뒤편으로 그곳을 찾아 들어가는 길은 설렘의 걸음이다. ‘대관령 양떼 목장’. 구 대관령 휴게소 뒤편으로 그곳을 찾아 들어가는 길은 설렘의 걸음이다.
봄을 맞을 채비가 한창인 눈 덮인 겨울의 자그마한 언덕 위는 어릴 적 만났던 동화 속의 목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언덕에 그려진 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 쓸쓸해 보이지만 자유롭게 서 있는 나무 오두막을 만나게 된다. 그 오두막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면 저 언덕 너머에서 반가운 얼굴이 손을 흔들며 걸어올 것만 같다.
오두막을 지나 얼마나 걸었을까. 곧 한반도의 뼈대, 백두대간의 장엄하고 고귀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된다. 백두대간을 곁에 두고 그 언덕 위에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면 자연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자연이 있음이 혈관을 타고 곳곳에 퍼진다.
겨울에는 방목하지 않아 축사 안에서나 양을 볼 수 있지만, 언덕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계절이 오면 그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양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쓰다듬고 먹이를 주며 양과 놀다 내려오면 매표소 맞은편에는 아직 보물이 잠자고 있다. 대지가 깨어나는 봄에는 온갖 야생화가 모습을 드러낸다. 산등성이는 붉은 철쭉으로 곱게 물든다.
꿈같은 평화와 자유가 지천으로 곳곳에 널리고 사계절 언제 가도 아름다움이 배어 나오는 곳, 마음의 여행은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일상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털어내기 위해, 서로 앞서지 못해 한 걸음도 쉬지 않는 치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향한 평창은 문학 숨결이 서려 있었고 자연의 품이 포근했던 곳이었다. 오대산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자연의 고귀함을 그대로 간직한 동강, 동화처럼 펼쳐지는 대관령 언덕,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소설 ‘메밀꽃 필 무렵’. 평창의 언덕 위에 오르면 자연과 문학이 함께 살아 있음을 목 언저리가 따뜻해지도록 한껏 느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