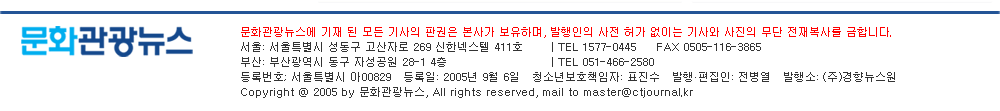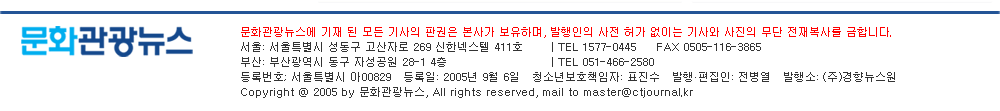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꿈꾼다. 노란 꽃망울이 봄기운을 알리는 도시, 나뭇잎을 스친 바람이 땀방울을 훔치는 도시, 오색 빛의 단풍이 거리를 뒤엎은 도시, 그리고 가지마다 설화가 곱게 피어나는 도시. 이렇듯 사계절 내내 나무와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꿈꾼다. 노란 꽃망울이 봄기운을 알리는 도시, 나뭇잎을 스친 바람이 땀방울을 훔치는 도시, 오색 빛의 단풍이 거리를 뒤엎은 도시, 그리고 가지마다 설화가 곱게 피어나는 도시. 이렇듯 사계절 내내 나무와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가로수는 그 도시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기후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 관광명소화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이로 인해 일찍부터 가로수가 조성된 도시에는 매년 수십,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가로수를 점차 병들게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간판을 가려 장사가 안 되고, 햇볕을 막아 농사를 망친다’는 등 오만 가지 이유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자체는 가지치기 한답시고 일용직 근로자를 모아 자신들의 예술적 잣대로 이리저리 나무를 난도질하고 있다.
도시 전체면적 가운데 약 20% 이상이 도로가 차지한다고 한다. 그곳에는 수종이나 수형이 어쨌든 간에 분명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녹음이 울창하게 우거진 가로수는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할 것이고, 반대로 몽당연필처럼 가지가 잘린 가로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가로수가 중요한 것은 잿빛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가득한 이 차가운 도시공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찮게 여긴 가로수가 아무렇게나 잘려지는 순간, 인간의 생명도 함께 잘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