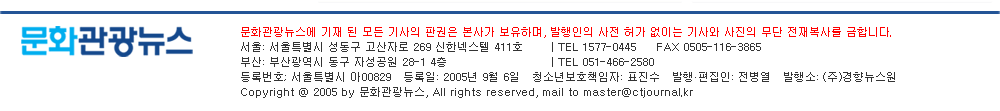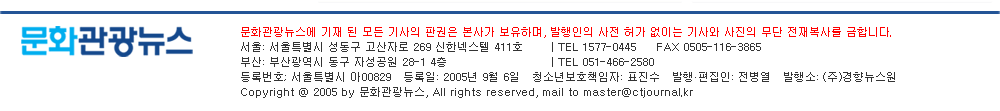|

ì¤êµì í¹ê¸ í¸í
ì ê°ì¤ì´ ì주 ëë¤. íìê° ë¬µì í¸í
ì í¸ì룸ì¼ë¡ ëë¶ë¶ ëë¸ë² ëê° 2ê°ì© ëì¬ììë¤. ì¤êµì ëê³ , í¬ê³ , ë§ë¤ë í¹ì§ì´ ëê»´ì§ë¤. ê±°ê¸°ë¤ íë ¤í¨ê³¼ ì
ì¥í¨ê¹ì§ ëí´ì§ë©´ ì¤êµì ìëê±°ë¦¬ê° ëë¤. ëì ê³µê°ì´ ì¤íë ¤ í¸ì íë¤. ìí´ì ì¼ê²½ì ë´ë ¤ë¤ë³´ë©° ê°ìì ì ì´ ì ê¹ì§ ì¤ì³¤ë¤. ì침 ìì¬ë ë·íìì´ë¤. ì¤êµ ì íµì리ì ììì¼ë¡ ì¤ë¹ë¼ ìì¼ë©° ê¹ì¹ë ëìë¤. ì²ìë³´ë¤ë ìµìíê² ì¤êµ ì리를 ì ë³í´ ìë¯¸í´ ë³¸ë¤.
ì¤ë ì¼ì ì ìí´ ì¤íêµë¥¼ ëµì¬íê³ ê³ ìì² ë í¸ì¼ë¡ ë¨ê²½ì¼ë¡ ê°ë¤ê³ íë¤, ìí´ì ë¬ìììë ìëì°¨ì ìì ê±°ê° ëë¡ë¥¼ ë©ì´ë¤. ê±´ë목ì ì§ë ëë ê·¸ì¼ë§ë¡ ì¸ì°ì¸í´ë¤. ì¬ë ëìì ë§ì°¬ê°ì§ë¡ ìí´ì êµíµì²´ì¦ ìì ëì기ë¥ì ì§ì¥ì´ ëê³ ìë¤. “íêµê³ ë±íêµì¥ ì¤êµì°ìë¨ ì¼íì íìí©ë뤔ë ì ê´íì´ ì
구 건물ì ë³´ìë¤. ‘ìí´ìêµì¬êµì¡ì¼í°ì¤í기ì§ë¶ìì¤íêµ(ä¸æµ·å¸å¸«è³å¹è¨ä¸å¿å¯¦é©åºå°é屬ä¸å¸)’ë 긴 ì´ë¦ì ìí´ì ì°ì íêµë¤. êµì¥ì ìëì¼ë¡ë¶í° íêµ ìê°ë¥¼ ë°ê³ ì¬íìë¤ì ê³µì°ì ê´ëíë¤. íìëíì ì¬íë¡ ì§íë í©ì°½ë¨ê³¼ ì°ì£¼ë¨, 무ì©ë¨ ë± íìë¤ì í¹ííëì´ ì°ë¦¬ êµì¥ë¨ì ìì ì ëìë¤. ì´ì´ì íìë¤ì ì°½ìë ¥ì 기르기 ìí ì¤ìµì¤ìì ì¬ë¬ ê°ì§ êµì¡ìì¬ë¡ ì°ë¦¬ êµì¥ë¨ì´ ì§ì ì²´íë íë ìê°ì ê°ì¡ë¤. ë¡ë´ì ë¹ë¡¯í´ ì¸í ëì´ ë± íìë¤ì ìíì¼ë¡ë ìì¤ê¸ì¸ ë°ëª
íë¤ë ì ë³´ìë¤. íë¥í êµì¬ê° ì¸ì¬ë¥¼ ì¡ì±íê³ , êµì¬ì ì² íì´ ì²ìë
ì ì¥ë를 ê²°ì íë¤ë ìê°ì´ë¤. ì
ì ì주ì 주ì
ì êµì¡ì¼ë¡ ì
ìì§ì¥ì´ ë¼ë²ë¦° ì°ë¦¬ì êµì¡ì ì±
ì´ ë ì¤ë¥¸ë¤. ì°ë¦¬ êµì¥ë¨ì ëëë ë³ë° ë¤ë¥´ì§ ìì ê² ê°ë¤. ‘íêµ ê³ ë±íêµì¥ ì¤êµì°ì 기ë
’ì´ë íê¸ê³¼ ë³íí íìë§ì í¼ì¹ê³ 기ë
ì´¬ìì¼ë¡ ëµì¬ë¥¼ ë§ì³¤ë¤.

ìí´ ì¤íêµ, ì¹ ë³´ë
¸ê° ì길ì ê°ë¤
ìí´ì ìê¸¸ì¸ ì¹ ë³´ë
¸ê°(ä¸å¯¶ï¤´è¡)ë¡ í¥íë¤. ë²ì¤ìì ë´ë ¤ ìí´ì ì íµ ê±°ë¦¬ì ìì¹í ‘ì¹ ë³´ë
¸ë°ì ’ìì ì ì¬ì íë¤. í¸ì§í ìí´ ì íµìë¦¬ê° ì½ì¤ë¡ ì´ì´ì§ë¤. ìì§í 주ìì´ ì·¨ìíë©´ì “ììì ë¨ê¸°ì§ ë§ë¼”ë í¹ë³ íìê° ììë¤ì§ë§ ì¤êµì í¸ì§í ìë¨ì´ 기본ìì ì´ë¤. ì°¾ì ìëì´ ììì ë¨ê²¨ì¼ ì ëë¡ ëì ì íë¤ê³ ë§ì¡±í´íë¤ë ê²ì´ë¤. “ë°°ë¶ë¬ ëë 못 ë¨¹ê² ë¤”ë ì¦ê±°ì´ ë¹ëª
ì´ ë¤ë ¸ì§ë§, ì²ë 맥주ì ìí´ì íµ ì½ì£¼ì¸ ‘í©ì£¼’를 ë°ì£¼ë¡ ê³ë¤ì¬ ë§ì
¨ë¤. ìê°ì´ ëëíë¤ë©´ ì·¨íê³ ì¶ì ì ë§ì´ë¤.
ìí´ì ì íµ ê±°ë¦¬ë¥¼ ê±°ëìë¤. ì¹ ë³´ë
¸ê°ë¥¼ ê°ê¸° ìí´ ì¿ë¹ ì´í를 ê±´ëë¤. ìë³ìë íì ê±´ë¬¼ì´ ëì´ì ê°ì´ë° ì íµ ê°ì¥ì¼ë¡ ì¡°ì±ë ìì ë¤ì´ ì±ì
ì¤ì´ë¤. ì ëì ë¤ë ì´ë°ì ì¬ì´ë¡ ì ë°í´ ìë¤. ì¤êµì ê°ë¬¼ì ëë¶ë¶ íìì´ë í©í ìì´ë¤. íë¬ë´ë¦¬ë ë¬¼ë³´ë¤ ê³ ì¬ ìë ë¬¼ì´ ë§ììì¼ ê²ì´ë¤. íì§ë§ ë¶ì ë¬¼ì´ ìì´ ìë¡ë ì²ê²°íê³ ì
ì·¨ê° ìë¤. ì¹ ë³´ë
¸ê°ìë ê³µìíê³¼ ì´ê³³ ì íµ ë¨¹ê±°ë¦¬ê° ì¦ë¹íë¤. ì°ë¦¬ëë¼ì ì íµìì¥ì ë°©ë¶ì¼ íë¤. ë보기를 ì¨ì¼ ë³¼ ì ìì ì ëì 깨ì ê°ì ê¸ì¨ë¡ ì¡°ê°ë ìíë¤ê³¼ ì¥ìíë¤ì´ ë길ì ëë¤. ì¸ê° ë¥ë ¥ì íê³ì ëì í ë¶êµ´ì ìì§ê° 묻ì´ë 걸ìë¤ì´ë¤. 모ë ê°íì ììë¸ë¤. ë°í´ë²ë ë°ë¬¼ê´ë ë³´ìë¤. ê°ì¸ ìì¥íë¤ì´ëë¤. ì íµ ë©´ì§ë¬¼ ê³µì¥ë 모íì¼ë¡ ë³´ì¡´íë©´ì ììì
ì¼ë¡ ë§ë ìë¥ í매ì¥ë ê´ê´ê°ë¤ì ê´ì¬ì ëë¤. í´ì¼ìë ì
ì¶ì ì¬ì§ê° ìì ì ëë¡ ê´ê´ê°ë¤ì´ ëª°ë ¤ë ë¤ê³ íë¤. ‘ë¶ì¡ì ì¡´(åå®éºå)ì´ë¼ ì긴 ë문ì ëì´ ëìë³´ë©´ ìë¦ë¤ì´ ì ì를 ë§ì£¼íê³ ì¹ ë³´ë
¸ê°ì í¨ë°©ì´ ëíëë¤. ë¶ì¡ì ì¤êµìì 960ë
ê²½ì ì¡°ê´ì¤ì´ ì¹´ì´í(éå°)ì ëìíì¬ ì¸ì´ ëë¼ë¡ 1127ë
ì ê¸(ï¤)ì 침ì
ì ë°ì ì ê°ì ë³ì¼ë¡ ìì¸ì ê°ë¨(æ±å)ì ìì(臨å®)ì¼ë¡ ì®ê¸¸ ëê¹ì§ë¥¼ ë§íë¤. ì´ê³³ ì¹ ë³´ë
¸ê°ë ë¶ì¡ ìëì 문íê° ë³´ì¡´ë ì§ìì¸ê°ë³´ë¤. ì§ê·í ìíë¤ì´ ì§ì´ë ìê°ë¤ì´ ë§ìì§ë§, ì¼ì ì ì«ê²¨ ë°ê¸¸ì ë©ì¶ì§ 못íë¤. ìì¬ìì ë¨ê¸´ ì± íêµ ê³ ìì² ëìì¼ë¡ í¥íë¤. ë¨ê²½ì¼ë¡ ì¼ì ì´ ì¡íì기 ë문ì´ë¤. ê´ê´ì ê·¸ ì§ìì 문í를 ì²´ííê³ ê·¸ ìë를 ëë ì ìì´ì¼ ë³´ëì´ ìì í
ë° ‘ìë° ê²í¥ê¸°’ ê´ê´ì´ ëë 기ë¶ì´ë¤.

ì¼ë°ì ì¼ë¡ ëì´ë¥¼ ííí ë “ì´ëì¥ë§ íë¤”ê³ íë©´ ìì²ëê² í° ê³³ì ë§íë¤. ì ë§ ì´ëì¥ì ëª ê° í©ì¹ ê²ë³´ë¤ë ë ëì ëí©ì¤ìë ê·¸ì¼ë§ë¡ ì¸ì°ì¸í´ë¤. ì´ë ê² ë§ì ì¸íê° ëª°ë¦¬ë ê´ê²½ì 본 ê±´ ìëí©ì¤ë¡ìë ëìì²ìì´ë¤. ì¤êµì ì°ë¦¬ ë¨í ë©´ì ì ì½ 100ë°°(960ë§ã¢)ë¡ 13ìµ 7,000ë§ ì¸êµ¬ê° ì¤ê° ëë¤. ì´ê³³ ìí´ë§ í´ë íêµì ì ë° ì ëì¸ 2,300ë§ ëª
ì´ëë¤. ì°ìì íì íê³ ë ìì§ë§, ìí´ì ì ì ì¬ì±ë¤ì ê²½ì ì ì´ì ë¡ ìì ì¶ì°ì êº¼ë¦¬ê³ ìë¤ê³ íë¤. í¹í ì ì êµì¡ë¹ë¥¼ ë¶ë´í기ì ë무 íë¤ê¸° ë문ì´ë¼ë ê°ì´ëë í¸ë
ì´ë¤. ê±°ëí ëí©ì¤ì ìë§ ëª
ì´ ì´ì§í´ìë ê´ê²½ì 목격í´ë³´ì§ ìê³ ë ë§ë¡ ì´ë£¨ íì©í ìê° ìë¤. íì§ë§ ì§ìì ì°íë¤. ê³ ìì² ëë ì´í ì¤ ìµê³ ììì´ 486.1kmì ëë¬íë©° ë¨ê²½ë¨ìê¹ì§ë íê· ìì 350kmë¡ ë¬ë¦°ë¤ê³ íë¤. ì¼ë° ì´ì°¨ë¡ 120ë¶ ì ë 걸리ì§ë§, ê³ ìì² ëë 75ë¶ ì ë ììëë©°, ìëê°ì´ë ììì í¬ê² ëê»´ì§ì§ ììë¤. ì°½ë°ì ì ê²½ì ì ì ì´ í리면ì í¼ë¡ì ì ê¹ ì ì´ ë¤ìëê° ë³´ë¤. ë¨ê²½ë¨ìì ëì°©í´ ë기íê³ ìë ë²ì¤ì 몸ì ì¤ìë¤. ì¡°ì 족 ê°ì´ë(ì´ìí·ë¨ 45ì¸)ê° ë¶í ìµìì ë¶ì íí ë°ìì¼ë¡ ê°ìì± ìê°ë¥¼ íë ê°ì´ë° ‘ë¨ê²½ì§ë§ì¥ë¹’ì ëì°©íë¤. ì´ í¸í
ìì 2ë°ì íê² ëë¤.
ì¤êµ ê´ê´ìì ê°ìì±(æ±èç)ì ì ì¸íë¤ë©´ ìë¯¸ê° ìë¤. ë¨ìª½ì ìë ¤í¨ê³¼ ë¶ìª½ì ì
ì¥í¨ì´ ì´ì°ë¬ì§ ê°ì´ë° ì² ë
ì ìì¬ë¬¸íê° ì´ì ì¨ ì¬ë ê°ìë ì°ê³¼ ë°ë¤, ê° ë± ì²íì ì ê²½ì ê°ì§íê³ ìì¼ë©°, ìë¡ë¶í° ê°ë¨ì ì´ë¯¸ì§í¥(éç±³ä¹é)ì¼ë¡ ‘ì¸ê°ì ì²ë¹’ì¼ë¡ ë¶ë¦¬ì´ìë¤. ì±ëì¸ ë¨ê²½ì 6,000ë
ì ê³ ë문í를 ê°ì§í ê³ ì¥ì¼ë¡ 2,400ì¬ ë
ì ëì ìì¬ë¥¼ ê°ì§ê³ ìë¤. “ê°ë¨ììë 미ì¸ì´ ëì¤ê³ , ê¸ë¦ì ì ìì ë§ë ë¤”ê³ íë¤. ë¨ê²½ì ì ìì ëìë¡ ì´ë¯¸ 50ë§ ë
ì ì ê³ ë ì¸ë¥ê° 거주íìì ìì¬ì ì¼ë¡ ì¦ëª
íê³ ìë¤. ë¨ê²½ ë쪽ì ìì¹í íì°ìì ììì¸ ì ê³¨ì´ ë°ê²¬ë ê²ì´ë¤. ëí, ëì¤, ëì§, ë¨ì¡°ì ì¡, ì , ì, ì§ ë± ì¡ì¡°ì ê³ ëìì¼ë©° ë¨ë¹, ëª
, ííì²êµ, ì¤íë¯¼êµ ë±ì ìëê° ìì¹í´ ‘ìì¡°ëì±’ì¼ë¡ë ë¶ë¦°ë¤. ë¨ê²½ì ì 구í 문íì ì°ê³¼ ìë ¤í ìì° íê´ì´ ì´ì°ë¬ì§ ê²½ì ëìë¡ì¨ ì¥ê°ì¼ê°ì£¼ì íëì§êµ¬ì ê²½ì , 문í, ê¸ìµ, 무ì ì¤ì¬ëìì íëë¡ ê³ ë ìì¬ë¬¸íì íë문ëª
ì´ ê³µì¡´íë ê°ë³ ìíëìë¡ ê±°ëëê³ ìë¤. ë©´ì 6,597ã¢ì ì¸êµ¬ë 8,161ë§ ëª
ì´ë¤. ê°ìì±ì ì ì²´ ë©´ì ì 70%ê° íì¼ì´ë©°. í¸ìê° 20%ë¡ ì 주ëë³´ë¤ ë¨ìª½ì ìì¼ë©°, ìí 4â~38â(íê· 16â)ì 기ì¨ì¼ë¡ ê°ì°ëì´ íë¶íê³ 2모ìì´ ê°ë¥í´ ì´ë¯¸ì§í¥ì ì¡°ê±´ì ê°ì¶ê³ ìë¤.
룸ì ë°°ì ë°ì ì¬ì¥ì íê³ ë§ì°¬ì¥ì¼ë¡ í¥íë¤. ‘íêµêµë¥ì¬ì ì¤ëª
í’ë¼ë ëí 모ëí° íë©´ì´ ì¤ì¹ë ë§ì°¬ì¥ìë ì°ë¦¬ ì¼íì ë¹ë¡¯í´ ê°ìì±ì¬ì êµê³¼ ê°ìì±êµì¡ì² ê´ê³ìê° ì리íê³ ììë¤. ìêµ ëíì ì¸ì¬ë§ì ì´ì´ ì¬ì êµ ê´ê³ìì ê°ì ê´ê´ìì ìê°ë¥¼ ë§ì¹ê³ êµì¡ì² ê´ê³ìë¤ì´ í©ìí ê°ì´ë° ìì¬ì ëë¶ì´ íë´ì´ ì´ë¤ì¡ë¤. ê·¸ë¬ë ê°ì´ëë íµììê° ìì´ë ìíí ìíµì´ ëì§ ëª»í´ ìíê¹ê¸°ë íë¤. ê°ãí¸ìê° ë§ì ì§ìì´ë¼ ì°ë¦¬ìê² ê·í 민물ì¥ì´ìë¦¬ê° ë§ì´ ëìì§ë§ 조리 모ììì 구미(å£å³)ê° ë¹ê¸°ì§ ììë¤. í¸í
주ë³ì ì¼ê²½ì ì¸ì ì´ë ë¶ë¹ì¡°ì°¨ ìì´ ì ë§íë¤. ìë´ ë²íê°ë¡ ë°ë§ì¬ì§ë¥¼ ë°ì¼ë¬ ê°ë ì¼íë ììì§ë§ 룸ì¼ë¡ ëìì ì¤ìë¡ í¼ë¡ë¥¼ íê³ ì ì리ì ë¤ìë¤. ì¦ê±°ìì¼ í ê´ê´ì´ í¼ë¡ê° ê²¹ì³ ì칫 컨ëì
ì ë§ì¹ ì ìë¤. í´ì¸ê´ê´ì ê±´ê°ê´ë¦¬ê° ì°ì ì´ë¼ë ê²ì ëª ì°¨ë¡ì ê²½íì íµí´ í°ëí ê²ì´ë¤.

‘天ä¸ç²¾æ°£’ ì¤ì°ë¦, ëª
í¨ë¦ ëµì¬
ì¤êµì í¸í
ë·íì ìì¬ë ë©ë´ê° ìë¹ì·íë¤. ìì¬ í ì¤ì°ë¦ì¼ë¡ ì¶ë°íë¤. 주차ì¥ìë ‘ì¤ì°ë¦ìí경구’ë¼ë ê¸ë°ê¸ì¨ê° ìê²¨ì§ ì»¤ë¤ë íì§ìì´ ì리íê³ ììë¤. ì¤ì°ë¦ì ê°ì°°êµ¬ë¥¼ ë¤ì´ìì ‘åæ’ ë í° í¨ë°©ì´ ë³´ìë¤. ì¤ì°ë¦ì ìì¤ì°(å«ä¸å±±·å«æ) ì ìì ë¥ë¬ë¡ ì¢
ì°ì ì 2ë´ ìëª¨ì° ë¨ìª½ 기ìì ë¨ë¶í¥ì¼ë¡ ì°ì¸ë¥¼ ë°ë¼ ì¡°ì±ë¼ ìë¤. ë¶ìª½ì í¸ë¥¸ ì ë²½ì ë°°ê²½ì¼ë¡ ë¨ìª½ì íì¼ë¥¼ ì¡°ë§íë©° ì°ì¸ì ë°ë¼ ë°ìíì ê´ì¥ê³¼ í¨ë°©, ë¬ë, ë¥ë¬¸, ë¹ì , ì ë¹, ë¬ì¤ë¡ ì¡°ì±ë¼ ìë¤. íë©´ëë©´ì ê²½ì¢
모ìì¼ë¡ ê±´ë¦½ë¼ “ì²íë¡ íì¬ê¸ 모ë ë를 ë°ë¥´ê² í뤔ë ìë¯¸ë¡ ì¤ì°ì´ ì¼íì êµë¯¼ì ì¼ê¹¨ì 주ë ê²ì ìì§íë¤ê³ íë¤. ì¤êµì¸ë¤ì ê·¸ì ì 족ãì êµì ì ì ìë°°íê³ ìëí íëª
ì ì 구ì, êµë¶ë¡ ì¶ìíê³ ìë¤. ì¤ì°ë¦ì 1926ë
ì ìê³µí´ 1929ë
ìê³µ, ê·¸ í´ 6ì 1ì¼ ì í´ê° ë´ìëì¼ë©°, í¨ë°©ìì ë¥ì¤ê¹ì§ë ìí거리 ì½ 700më¡ 392ê°ì ê³ë¨ì¼ë¡ ì¡°ì±ë¼ ìë¤. ì´ë©´ì ì 2,000무(133ë§ 3,300ã¡)ë¡ ì²¨ì(ç»ä»°)íë ì¬ëì´ ìë¡ ì¬ë ¤ë¤ë³´ë©´ ì¸ì°½í ì림과 í¸ë¥¸ 기ì, ìë¹ ë´ì¥ì´ ì´ì°ë¬ì ¸ ì¤ì°ì í¸ì°ì ê¸°ê° ì²ì§ì ëê»´ì§ë¤ê³ íë¤.
ì림ì ì§ëì ‘å¤©ä¸ç²å
¬’ì´ë ì¤ì°ì ì¹íì´ ê¸ë¹ì¼ë¡ ìê²¨ì§ ê±°ëí ë¥ë¬¸ì´ ëíëê³ ì쪽ì ì¬ììì´ ì§í¤ê³ ìë¤. ì´ ë¥ë¬¸ì ë³µê±´ì± íê°ìì¼ë¡ 건립ëì¼ë©°, ì§ë¶ì íëì ì¤ì§ê¸°ìë¡, 3ê°ì ìì¹í ë문ì ëì¼ë¡ ì¡°ê°ëë¤ê³ íë¤. ë문ì ì§ëì ì
ì¥í ë¹ê°ì´ ì리íê³ ìë¤. ì´ ë¹ê°ì ëë 12m, ëì´ 17më¡ íê°ìê³¼ ì¤ì§ê¸°ìë¡ ì¡°ì±ëì¼ë©°, ë¹ìì ëì´ 8.1m, í 4mì´ë¤. ‘ä¸ååæ°é»¨è¬ 總çå«å
çæ¼æ¤'ë¼ê³ ìê²¨ì§ ê¸ì ë¹ë¬¸(ç¢æ)ì êµë¯¼ë¹ ìë¡ì¸ ë¨ì°ê°ì ì¹íì´ëë¤.
ë¹ê°ì ì§ëë©´ íëê³¼ ë§ë¿ìë¯í ì
ì¥í ì¤ì°ì ì ë¹(ç¥å )ì´ ì°½ê³µì ìììë¤. ‘天å°ç²¾æ°£’ë ê¸ë¹ ì°¬ëí ì¤ì°ì ì¹í ìëë¡ æ°æ, æ°æ¬, æ°çì´ë ê¸ë¹ ê¸ìê° ëì ë¤ì´ì¨ë¤. ì´ê¸ì êµë¯¼ë¹ ìë¡ ì¥ì§ì¥(å¼µéæ±)ì ì¹íì´ë¤. ì ë¹ì ì¤êµê³¼ ììì ê±´ì¶ í¹ìì ê²°í©íì¬ ê±´ë¦½íë¤ê³ íë¤. ì ë¹ì ë¤ì´ìì ì¤ìì ì¤ì°ì ë°±ì¥ ëìì´ ììíê² ì리íê³ ììì¼ë©°, ì´ íë°±ì¥(æ¼¢ç½ç) ì¢ìì íëì¤ ì¡°ê°ê° ‘í´ë¡ ëí°ì¤í¤’ê° ì¡°ê°íë¤ê³ íë¤. ê´ë¦¬ìì´ ì´¬ìì ì ì§íì§ë§, ë
ì를 ìí´ì ëª ì»· ì°ìë¤. ì ë¹ ì쪽 벽면ìë ê·¸ì ì ì ‘ê±´êµëê°’ ì ë¬¸ì´ ê¸ë¹ì¼ë¡ ì¡°ê°ë¼ ììë¤. ë¥ì¤ ì¤ììë ì²´ì½ ì¡°ê°ê° ‘ì½ì¹’ê° ì¡°ê°í ì¤ì°ì ììì´ ì리íê³ ìë¤ê³ íëë° ì¶ì
ì´ ê¸ì§ë¼ ììë¤. ëì ë¤í¸ì ‘浩氣é·å’ì´ë¼ê³ ì긴 ìì¤ë¬¸ì´ ë³´ìì§ë§ ìì½ê²ë í문ì´ë¤. ì¤ì°ì ì ì²´ê° ê·¸ê³³ ì§í ì ëê´(ç´«é
棺)ì ìì¹ë¼ ìë¤ê³ íë¤. ì ë¹ ì ììì ë´ë ¤ë¤ë³¸ ì¤ì°ë¦ì ê±°ëí ìì¸ë íìì§ë¦¬ì 문ì¸íì¸ íìì ì목ì¼ë¡ë ì²í를 íì 기ìì ëë ¤ìì´ ëê»´ì¡ë¤.

ìê°ì ì«ê²¨ íê²ì§ê² ë²ì¤ì ì¬ëë¤. 기ë¡ì¼ë¡ëë§ ì íê³ ì¶ì ë§ìì ì´¬ìì ì ê²½ì ì°ë¤ ë³´ë©´ ê°ìë³´ë¤ë 그림 ì¢ì ì¥ì를 ì«ìë¤ë ìë°ì ìë¤. ì¬ì§ì ìë§ì¶ì´ì¸ íìê° ì´ë´ì§ë ì 문ê°ë ì ë§ ê³ ë ì¼ê³¼ì¼ ê²ì´ë¤. ë¤ì 방문ì§ë ëª
í¨ë¦ì´ë¤. ì ì í´ìì ì·¨í ì ìë ëê° ì´ëìê°ì´ë¤.
ëª
í¨ë¦ì ëª
(æ) ìì¡°ì ê°êµí©ì 주ìì¥(æ±å
ç)ê³¼ ë§(馬) í©íì í©ì¥ë¬ë¡ ì¢
ì° ë¨ìª½ 기ì ë룽í¸(ç¨é¾é)ì ìì¹íë©°, ëª
í무 ì°ê°ì 건립ëë¤. ë¥ë¬ì ëë ë ë¬´ë ¤ 45리(ì½ 180m)ì ë¬íë©°, ë¹ì (ì¬ë°©ì±)ãì ëãë¹ì ãí¥ì (í¨ë¦ì )ãë°©ì±ãëª
루ãë³´ì± ë±ì ê±´ë¬¼ì´ ë³´ì¡´ë¼ ìë¤. ëª
í¨ë¦ì ì¤êµìì íì¡´íë ê°ì¥ í° ì ìë¦ì¼ë¡ì ì¤êµ ê³ ë ë¥ë¬ ê±´ì¶ì ì íì´ ëê³ ìì¼ë©°, ì¸ê³ë¬¸íì ì°ì ë±ë¡ë¼ ìë¤.
ì
구ìë ëê¸ë¬¸ì´ ììë¤. ëê¸ë¬¸ì ëª
í¨ë¦ ì¸ê°ì ì 문ì¼ë¡ 첫 ë문ì´ë¤. ë¨í¥ì¼ë¡ 3ê°ì ì¶ì
êµ¬ê° ìê³ ëë¡ ë ëê¸ë¬¸ 기ì´ë¶ë¶ê³¼ ì¤ê° ì¡°ê° ë¶ë¶ì ëª
ëë¼ ì´ê¸° ê±´ì¶ì ìë¡ì´ íí를 ë³´ì¬ì¤ë¤. ë문 ìë¶ë¶ì ì°ë´ì°ë¦¬ ííì íì²ë§ì´ë©° í©ê¸ì ì¤ì§ê¸°ìë¡ ë®ìì¼ë í¼ìëë¤ê³ íë©°, ëê¸ë¬¸ ì쪽ì ì¸ê³½ ì±ë²½ê³¼ ì´ì´ì¡ëë° ìì§ë ê·¸ íì ì ì°¾ìë³¼ ì ìë¤ê³ íë¤.
ì ê³µì±ëë¹ë£¨ë ëª
ëë¼ ìë½ 11ë
(1413ë
)ì 건립ëì¼ë©°, ê±´ì¶ íë©´ì´ ì ë°©íì´ê³ 건물 ì ìì´ í¼ìëë¤. ‘ì¬ë°©ì±’ì´ë¼ê³ ë ë¶ë¦¬ë©° 건물 ë´ìë 주ìì¥ì ë·ì§¸ ìë¤ ‘ëª
ì±ì¡° 주체’ê° ê·¸ì ë¶ì¹ì ìí´ ì¸ì´ ‘ëëª
í¨ë¦ì ê³µì±ëë¹’ê° ì¸ìì ¸ ìë¤. 주체ì ì¹íì¸ ë¹ë¬¸ìë 2,746ìë¡ ì£¼ìì¥ì ì
ì ì´ ê¸°ë¡ë¼ ìì¼ë©° ë¨ê²½ì§ììì ê°ì¥ í° ê³ ë ë¹ìì´ë¤.
ëê¸ë¬¸ì ì§ëì ì ë(ç¥é)ê° ê¸¸ê² ì´ì´ì§ë¤. ì ëë ì§ì ì¼ë¡ ë¤ìí ë물 ììì´ ì¸ìì ¸ ìë 길ì´ë¤. ììë¡ë í¨ë¦ì ëì 첫 ë¶ë¶ì¼ë¡ì 길ì´ê° 615mì´ë©° ì¬ì를 ë¹ë¡¯í´ í´í, ëí, ì½ë¼ë¦¬, 기린, ë§ ë± 6ì¢
ë¥ì ë물ìì´ ì°¨ë¡ëë¡ ì¸ìì ¸ ìë¤. ì´ ììë¤ì í° ë°ì를 ì´ì©íì¬ ìì¡°ì¡°ê°ê¸°ë²ì¼ë¡ ë§ë¤ì´ì¡ëë° ì¡°ê°ì ì´ ì ëª
íê³ ë¶ëë¬ì°ë©°, ê¸°ë°±ì´ ì
ëíê³ íê²©ì´ í¸íí ê²ì´ í¹ìì´ë¤. ì´ë í©ì ë¦ì ìê³ í¨ê³¼ ì±ê²°, íë ¤í¨ì ëíë¼ ë¿ë§ ìëë¼ ë³´í¸ì í´ì
ë°©ì§, ìì를 ìì§íê³ ìë¤ê³ íë¤. ì¤ì°ë¦ì ì ë를 ë물ì ëì ë무를 ì¬ìë¤. ìëì ë³ì² ë문ì¼ê¹ ìëë©´ ìííê²½ì ìí ì 견ì§ëª
ì¼ê¹.
ì ë ì¤ë¥¸í¸ì ìê¶ë¬ê° ì리íê³ ììë¤. ìê¶(å«æ¬)ì ì¤êµì ì¼êµìë ì¤ëë¼ì ì´ë í©ì ë¡ì, ê°ì´ëì ìë´ê° ìëìì¼ë©´ ì§ëì¹ ë»íë¤. ë¬ë ë³´ì´ì§ ìê³ ‘å«æ¬å¢’ë¼ë ìì ë¹ìë§ ì¸ìì ¸ ìì¼ë©° ë¬ìì 매íëìì¼ë¡ ì¡°ì±ë¼ ì´ê³³ 매ì¤ì´ ì§ì í¹ì°ë¬¼ë¡ ì ëª
í´ì¡ë¤ê³ íë¤. 주ìì¥ì ìê¶ì´ ì기를 ì§ì¼ì¤ ê²ì´ë 믿ìì¼ë¡ ì´ê³³ì ë¬ìì ì¡ìë¤ê³ íë¤.
ì ë를 ì§ëì ì목ì¼ë¡ ì¡°ì±ë ì
ì¤ë¡(ç¿ä»²è·¯)ê° ëíë¬ë¤. ì´ ê¸¸ì ëª
í¨ë¦ ì ëì ë ë²ì§¸ ê¸¸ë¡ 250mì 거리ì´ë©°, í ìì ë§ê¸°ë¥ê³¼ ë ìì 문ê´ê³¼ ë¬´ê´ ììì´ ì§í¤ê³ ìë¤. ê¸°ë¥ ììë ì주í ììì¼ë¡ 구ë¦ê³¼ ì©ì 모íì´ ì¡°ê°ë¼ ììë°, ì´ë ë¹·ì¡ ìëì ì ë ê¸°ë¥ ìì ì¡°ê°ë ì°ê½ê³¼ë ë¬ë¦¬ ìë¡ì´ í¹ìì ë³´ì¬ ì£¼ê³ ìë¤ê³ ìê°íê³ ìë¤. ëª
í¨ë¦ì ë¥ë¬ê° ìê³ ê·¸ë¥ ì¼ì°ì´ë¤. ë¹ìë ì êµ°ì´ë ìì ë¤ì´ ì íí ë¬ì ìì¹ë¥¼ ìì§ ëª»íê² í기 ìí´ìë¼ê³ íë¤. ìì§ ë°êµ´íì§ ìê³ ìë¤.
ì¤ì°ë¦ê³¼ ëª
í¨ë¦ì ìë´íì 모ë ì¤êµì´ì ìì´, ì¼ì´, íêµì´ë¡ íê¸°ë¼ ìë¤. íêµ ê´ê´ê°ì ììì´ ê·¸ë§í¼ ëìì§ ê²ì´ë¤. ê·¸ë°ë° íìë¤ì 방문ë ë§ìë° ë§ì¶¤ë²ì´ í린 문ì¥ì´ ë§ì ìíê¹ë¤. ì¼ì ë문ì ìì½ê²ë ëª
í¨ë¦ì 모ë ëìë³´ì§ ëª»íê³ ë¤ì ì¥ìë¡ ì´ëí´ì¼ íë¤.
|
|